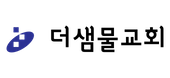사랑의 그릇을 함께 준비합시다
사랑의 그릇을 함께 준비합시다 코로나 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는지 안부를 묻던 불안한 날들이 다시 온 듯합니다. 우리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더샘물교회 코로나19 관련 결정사항-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회 당회와 운영위 5차 결정사항> 지난 주일(4/19)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을 완화하여 종교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하였고, 코로나19의
더샘물교회 코로나19 관련 결정사항-4
지난 주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막고자 온라인 개학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당분간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을 질서 있게 살아요
일상을 질서 있게 살아요 어제 정부가 다시 탄력적 개학연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어제 당회와 운영위의 결정을 따라 3월 29일, 4월5일 주일까지 온라인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더샘물교회 코로나19 관련 결정사항-3
[더샘물교회 코로나19 관련 결정사항-3] 오늘 오후 2시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개학의 추가 연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도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2월
면역력을 퍼뜨리자
면역력을 퍼뜨리자 지난 주에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면역력을 퍼뜨리자.” 열어보니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건강보조제 상품들을 구매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홍삼, 영양제, 프로폴리스 같은 제품들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염려가 커질 때,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