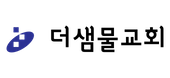“…불란서 사람들은 해가 지고 사물의 윤곽이 흐려질 무렵을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이라고 한대. 멋있지? 집에서 기르는 친숙한 개가 늑대처럼 낯설어 보이는 섬뜩한 시간이라는 뜻이라나 봐. 나는 그 반대야. 낯설고 적대적이던 사물들이 거짓말처럼 부드럽고 친숙해지는 게 바로 이 시간이야.”
[박완서,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 중에서]
프랑스에서는 남부 양치기들의 관용어에서 유래한,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l’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답니다. 해질녘 석양이 붉게 물들고 땅거미가 내리면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이 나를 위해 양을 몰아주는 개인지, 나와 양떼를 해칠 수 있는 늑대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시간을 말합니다. 빛이 어둠으로 옮겨가는 시간, 옳고 그름을 혼동하기 쉬운 중립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입니다.
믿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하박국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삶을 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어느 사람의 말처럼, 예수를 믿으면, 삶의 고단함이 다 증발되고, 꽃 길이 열려서 힘들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약탈과 폭력’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더 큰 약탈과 폭력을 가진 바벨론이 옵니다(합1:6).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자기가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자들’입니다(합1:7). 하박국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인생에 담기에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사자 피하다 곰을 만난 시대입니다. 앗시리아의 위기가 지나가자 바벨론이라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위기의 연속인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엔 ‘하나님의 응답인 공습해온 바벨론’이 신자를 물고기 잡듯 하고, 세상엔 바벨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의 성능이 좋아서 그물에 제사를 지내듯이, 자기 힘과 군사력을 숭배합니다(합1:12-17). 이 현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인지,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상황의 어스름 속에 있고, 질문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으로 돌아와도 하박국이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하면서 자기 초소, 망대인 ‘나의 자리’(합2:1), ‘나의 선 자리’(합3:16, 번역에서 생략되었으나 원문에 있는 문장)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은 당할 때는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박국을 통해 햇살아래 선 것처럼 또렷해집니다. “너는 이 묵시를…판에 새겨서…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더디 오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합2:2-3).
의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신실함으로 삽니다(합2:4). 그 신실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깃듭니다. 오늘 우리는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또렷한 약속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깃들게 해서 누군가 그 혼돈의 어스름 속에서 우리 더샘물교회 신자들의 일상을 만날 때, 예수를 읽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겨울 햇살 아래 선 것처럼 또렷하고, 따뜻하게.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이찬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