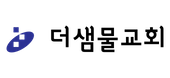예수님, 사람의 무늬를 아시나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손님을 청하고 오기 전 한 시간의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래 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귀한 분과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오늘 만나서 인연이 이어진다면, 천천히 알아가게 되겠지요. 흔히 사람이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표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사람만 그럴까요? 저는 자녀들이 크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예쁜 녀석이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면서 아까운 결별을 했는데, 제가 강아지를 그리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아지의 난 자리조차 표가 많이 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그 녀석이 질근질근 씹었던 탁자 모퉁이의 무늬를 볼 때마다 함께 했던 시간과 기억이 떠오릅니다. 살아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인문학이 몇 년 동안 계속 유행입니다. 경영에도 인문학 경영이라는 제목이나 부제를 가진 책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습니다. ‘인문(人文)’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무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늬를 지니고 삽니다. 시대를 통과하며 생긴 사람의 무늬와 그 누적된 사람됨과 역사를 배우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작고하신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는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인문학의 경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더 묻기로 하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는 어느 별빛 아래 태어나는 법. 어느 땅 흙을 밟고 자라는 법. 어느 숲의 공기를 마시고, 어느 골짜기 샘물을 마시는 법. 민들레나 할미꽃, 제비꽃 피는 들판에서 달리고 숨 쉬었던 것. 어디서 배우고 언제 군복을 입었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고, 누구를 만나 즐겁고 괴롭고 슬펐는가. 사랑은 어떻게 했고, 어느 골짜기에서 수행했으며 또 어디로 헤매고 다녔으며 남을 위해 무엇을 했고 자기의 저장고엔 어떤 꿀이 저장되어 있으며, 마침내 어떻게 그는 죽었는가.”
인문학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다시 희망하는 사람됨을 잊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의 퇴적입니다. 사람은 어떤 탄생의 무늬를 지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랑과 증오 그리고 협력과 파국과 전쟁과 평화가 이루어졌는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무늬를 살피고, 오늘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고 살아가야 하는 지를 묻는 철학과 사람들이 살아간 시간의 화석 속에서 사람됨을 발견하려는 역사 그리고 늘 시대의 단면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수 백 년 전의 글도 읽으면, ‘살아 있는 오늘’로 재현시키는 문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인문학은 서툴지만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절망의 무늬는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오신 귀한 분의 생애가 살아온 삶의 무늬를 아십니다. 그 절망과 눈물의 무늬가 슬픈 운명의 불처럼 무늬 지어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 ‘달콤짭쪼롬한 예수님’을 함께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2019년 11월
귀한 분을 모신 설렘으로,
이찬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