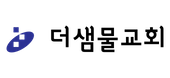사순절 화평_주님과 사이좋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난 한 주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화평’을 추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롬 14:19에서 바울은 교회를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화평을 구하는 건, 화평이 우리 본성의 열매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증오가 화평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 편 아니면 네 편만 존재하는 이분법의 세상에 삽니다. 둘 중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리기에, 적대적인 대상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없는 세상, 화평이 사라진 세계입니다. 1980년대 이분법의 세상을 반대한 문학적 사조가 일어납니다. ‘시운동’입니다. 그중 한 사람인 박덕규 시인은 ‘사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사이가 있었다 그/사이에 있고 싶었다//양 편에서 돌이 날아왔다” 2연의 짧은 시 속에 이분법 세상 사이에 서서 평화를 구하던 젊은 시인의 고뇌가 담겼습니다. 20년쯤 지나 이 시를 읽고 공감해서 자기 시대에 밝게 해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영화음악을 소개하는 DJ로 인기가 높았던 정은임 아나운서는 박덕규의 시 ‘사이’를 패러디해서 ‘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싸이를 했다//양편에서 도토리가 날라왔다 ㅎㅎ” 당시에 싸이월드가 인기였거든요. 박덕규의 시와 더불어 이 글이 동시에 기억에 남은 건, 우리 모두가 이분법의 세상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자랍니다. 사람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는 건, 빽빽한 나무만이 아닌, 그 사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봅니다. 그 사이와 간격은 담과 벽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무수한 차이, 높은 나무와 키 작은 나무, 상수리나무와 소나무…그 교차와 대칭이 만든 색깔과 모습이 숲을 이룹니다. 숲은 각종 넝쿨 식물과 관목까지 어우르는 공간(空間, 빈 사이)입니다. 그 공간을 서로를 죽이려는 교두보로 만드는 건, 상대방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화평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맛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분법 세상은 이미 깨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큰일은 화평을 깨는 이분법의 담을 허물고,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서서 서로 돌을 던지며 적대하던 원수의 경계와 막힌 담을 십자가를 지신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엡 2:14-15).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오래된 새 길입니다. 예수는 우리 존재를 바꾸시고, 신자의 주소지를 하늘 예루살렘으로 등기이전하셨습니다(갈 4:26). 땅에서, 파송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초청해 함께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사이가 좋다’는 건, 단지 말이 통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루신 화평의 품에서 손을 맞잡고, 예수로 어깨를 건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이라는 겁니다. 사이좋으신가요? 예수의 화평을 계속 구하세요. 주님과 사이좋게, 이웃과 사이좋게.
여러분과 함께 화평을 구하는 사순절을 지나며,
이찬형 올림